짓큐사니 오해
모든게 다 엉망이었다. 그나마 명확하고 확실한 것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실책이라는 거겠지. 이렇게 많은 피는 난생 처음 봤다. 병원에서 일해본 적이 없으니 이런 광경을 볼 리가 있나. 게이트를 타고 흐르다 바닥으로 흩어지는 피는 순식간에 검게 변하는 듯 했다. 빨간 피, 라는건 어디까지나 인간의 몸뚱아리 안에나 들어 있을 때의 이야기인거고. 이렇게, 너무 많이 쏟아지면 피는 붉게 보이는 게 아니라 좀 더 새카만 빛을 띄는구나. 얼어붙은 머리는 처음 본 그 광경을 받아들이려고 애쓰고 있었다. 중상이란게 이런 거였어. 물건이야 깨지면 버리면 그만이라지만 인간의 육체를 띄고 있는 칼들이 깨진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나? 이제서야 확신하건데, 죽을 때까지 무리가 아닐까. 쏟아지는 듯한 몸을 정면으로 받아내면서도 힘없이 기대오는 무게가 지극히 비현실적이었다. 선 채로 반쯤 무릎꿇은 그를 간신히 끌어안고 있는게 전부였다. 품안에서 겨우 고개를 드는 시선을 마주쳤다. 이해가 가지 않는 듯 일그러지는 눈가에 불 같은 상처가 꿈틀거렸다.
"왜...예쁘다고 안 해줘?"
참지 못한 눈물 한 줄기가 결국 볼을 가로질렀다. 나 같은 거에게 잘 보이고 싶다며 애써 빛을 발하는 네가 예쁜 거였지, 나는.
카센사니 카페라떼
사니와는 커피파였다. 가장 좋은 것을 낼 셈으로 두춘의 연심사봉을 덜어내던 카센의 손이 멈췄다. 찻상을 무르는 게 나은가, 하고 잠시 고민하니 그제서야 차를 덜던 카센을 아일랜드 너머로 마주친 사니와의 시선이 순식간에 어색해졌다. 겸연쩍은 듯 사선이 사선 아래로 떨어졌지만 취향이 다른 것을 어찌하나, 차통을 다시 눌러 덮은 카센이 난처하게 웃었다. 알록달록한 봉투를 슬그머니 들어 입을 가린 사니와가 슬그머니 눈을 마주쳤다가 데인 듯 화들짝 시선을 피했다.
"저, 괜찮으면 제가 올려볼게요..."
꽃 같은 모란의 웃음에 사니와는 숫제 귀가 터질 것 같은 기분이었다. 무녀님 비슷한 일을 한다고만 들었지 이렇게까지 잘생긴 사람하고 한집살림 한다는 말이 없었잖아요 공무원 미친놈들아.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는 행동 끝에 아일랜드에 선 사람과 앉은 사람의 위치가 바뀌었다. 그라인더를 돌리는 손이 떨리진 않을지 고민을 좀 하면서 부엌에는 순식간에 사각사각 하는 그라인더 소리만 채워졌다. 차를 마실 정도라면 역시 무난한게 좋겠지? 골리려는 거였다면 레드아이 같은걸 만들었겠지만 일단은 잘 부탁한다고 하는 자리가 아닌가. 이 비싼걸로 라떼를 처먹을거면 왜 먹느냐는 친구의 비명이 귓가에서 어른거렸지만 내린 커피를 가득 붓고, 제 잔에는 조금만 붓고선 우유를 따라 얼음을 두셋 더했다. 커피향이 가득 찬 부엌은 제법 흡족했고, 잔을 내려다보던 모란은 잔을 조금 앞으로 내밀더니 저도 얼음을 달라는 듯 어딘가 묘하게 웃었다.
"나도 찬게 좋은걸"
※왜 중국차냐면 글쓴이가 일본차 알못이기때문
노리쵸기 / 개그.... (자신없음...우회...)
노리무네x쵸우기 맞겠지 아닐시 다시 냉동창고감
상성이 좋지 않다. 상성이. 둘이 붙여 놓으면 사고는 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에 쵸우기는 반쯤 좌절하고 있었다. 내가, 내가 사고를 친 적이 이 혼마루에서 있을리가.. 하고 이를 갈고 있어도 태평하기 짝이없는 사니와는 한번 뱉은 발언을 별달리 취하해줄 생각이 없는 듯 했다. 그 결과가 이꼴이었다, 툇마루 위에 윤왕좌로 앉아 원경을 멀거니 바라보던 노리무네는 부채를 펴더니 무언가 고심하는 듯 하더니 소리나게 부채를 접고선 다시 입가를 톡톡 두드렸다. 삼일째 듣는 소리라고는 부채를 폈다 접었다 하는 소리가 전부였던 그로서는 tv에서 봤던 속쓰림 위장약 복용전 사진이 머릿속으로 무수히 돌아가고 있었다. 주명을 무시할 셈은 아니었으므로 툇마루에 퍼져 있는 늙은이의 옆으로 두걸음 하고도 조금 앞에 서서 본체에 손을 얹고 앞을 본채 가만히 서 있는것 만이 삼일 내내 쵸우기가 하고 있던 것의 전부였다. 노리무네는 지치지도 않은지 평소 헛으로 두던 바둑판은 내버려두고 하루종일 부채만 접었다 폈다 하면서 하릴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위장이 따끔거리기 시작해 고개를 돌리고 허리춤에 매단 수통을 꺼내 기울이다, 시선 끝에 걸린 무언가때문에 흘긋 눈길을 돌렸다. 여전히 고심을 하듯 노리무네의 부채 끝에서 기묘한 균형을 잡으며 빙글빙글 도는 것은 분명-
"풉,"
마시려던 물의 반을 도로 뱉어내긴 했지만, 분명 이곳으로 눌러앉을때 반납해야 했던 직속감사관 직인이였다
고코사니 첫사랑
효율이 안맞아 효율이, 그런 말을 종종 흘리던 주인은 검들의 원에도 쉽사리 수행을 허락하지 않았다. 예외라고 한다면 일부 단도들이었을까. 그마저도 다섯 중 세번의 합전밖에 끝내지 못한 저를 보던 사니와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했다. 정말로 충분했을까 하는 말에는 어쩔 수 없이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었지만, 허락된 기회는 그것이 전부였음을 알았다. 마음 속에서 일어나려는 것이 쓸데없는 싹임을 알고 있었기에 따뜻한 온기 옆에서 눈을 감고 그것을 잘랐다.
눈이 내릴듯말듯 가물거리던 날이었다. 결국 내리기 시작한 눈을 창 너머로 보다 시계를 언뜻 보니 사니와가 귀성하겠다 말했던 시간이 가까워졌기에 마중을 나가야겠다는 생각에 내성의 입구 쪽으로 향했다. 톡톡 앞굽을 두드려 착화를 마무리짓자 금새 느긋한 짐승의 발자국 소리가 뒤를 이었다. 눈이 내리기 시작한 것 때문인지 바람은 어느샌가 그쳐 있었다. 게이트에서 돌아오는 인영은 하나가 아니었다. 예상한 적 없는 광경에 고코타이는 멍하니 입을 벌렸다. 사니와의 손을 붙잡고 선 새빨간 후리소데 차림의 자그마한 아이는 절로 시선을 끌 정도로 겨울 한가운데 핀 동백꽃 같았다. 사니와는 기다란 막대 같은 것을 아이에게 쥐어주고선 고코타이에게 가보라는 듯 어깨를 가볍게 툭 쳤다. 까만 눈동자가 마주치자 고코타이는 어째서인가 조금 어지러운 듯한 기분이 들었다.
"오늘이 귀수라서 말야, 아무래도 시치고산은 마쳐야 소개를 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치토세아메는 둘이서 나눠 먹을래? 같은 소리를 했지만, 고코타이의 귀에는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한참을 멍하니 바라보다 겨우 깨달은 말이라고는 제 주인이 가장 마지막에 흘린 듯한 말만 겨우 알아들을 수 있었다.
"자, 네 근시에게 인사해야지"
카네사니
사니와가 가장 좋아하는 때를 고르라면 저녁을 먹고 난 후의 시간을 고를 텐데, 이유는 달리 없이 심플했다. 관리하기 힘들다며 저는 썩둑 잘라버린 머리를 향한 꾸밈의 대리욕구를 유일하게 허하는 사람이 어린 카네사다 뿐이였고 손질을 허락할 만한 여유로운 시간이 대부분 그 때였다. 언제고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다른 남사도 있지 않느냐 물으면 사니와는 많이 떨떠름한 얼굴로, 만족스러울 정도로 머리가 길거든 대부분 너무 고검이라 위압감에 입도 못 열겠다며 우물쭈물했다.
주인이 쫄린다는데 별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카네사다는 결국 사니와의 장난감을 반쯤 자처하고 말았다. 자기 머리도 아닌데 매번 진심으로 임하곤 하는 제 주인은 집중하면 한시간도 넘게 남의 머리를 잘 붙들고 있곤 했다. 가끔 그렇게 공들여 매만진 제 머리를 통신기로 찍어 가곤 했는데 누군가 제지하진 않는 듯 했다. 어디다 올리는게 문제가 됐다면 알아서 제 주인이 시간청에서 된통 깨지고 왔을 텐데 그런 기색은 보이지 않았으니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겠지. 반쯤 앉아서 졸다가 사락거리는 소리에 잠이 깼는데, 풍경마냥 소리추 같은게 달린 장신구를 가져와서 머리에 끼워넣어가며 땋은것이 흔들리면서 나는 소리였다. 눈만 굴려 사니와를 바라보니 정말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대충 손톱만한 폭으로 머리를 땋아내리고 있었다. 저게 저리도 좋을까. 그렇지만 저 몰입하는 듯한 모습과 품에서 곁에서 은은하게 피어오르는 간질간질한 향이 좋았기에 댓시간도 넘게 걸리곤 하는 이 장난질의 시간이, 카네사다는 그리 나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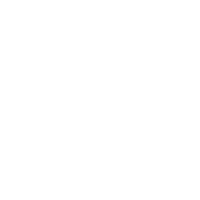
센세 감사합니다 적게일하고 많이버십쇼
카네상 커여웟
감ㅁ사합니다!!!!!!!!!!! - dc App